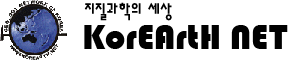새소식
새는 '활강 공룡'의 후손
orange100
0
6,172
2012.11.22 21:58
[한국일보 ; 2012년 11월 22일]
새는 '활강 공룡'의 후손
날아 오르진 못했지만 높은 곳에서 활강하는 방식으로 이동했던 깃털 달린 공룡들이 오늘날 새의 조상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디스커버리 뉴스가 21일 최신 연구를 인용 보도했다.
미국 예일대 연구진은 약 1억5천500만년 전에 살았던 안키오르니스(Anchiornis huxley)와 1억6천800만~1억5천200만년 전에 살았던 에피덱시프테릭스(Epidexipteryx) 등 깃털 달린 활강 공룡들이 조류의 시조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최고(最古)의 새로 알려진 `시조새'(Archaeopteryx)와 안키오르니스의 화석을 조사한 결과 둘의 날개 깃털이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지 않고 둘 사이의 차이는 날개의 진화 과정에서 초기의 실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화의 본질상 어느 시점에서 공룡이 끝나고 새가 시작됐는지 분명한 구분은 없다. 깃털은 처음엔 보온용 솜털로 시작해 점차 날개로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시조새는 여러 겹의 긴 비행용 깃털을 갖고 있었지만 안키오르니스는 펭귄의 깃털처럼 단순한 띠 모양의 깃털들이 풍성하게 겹쳐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연구진은 긴 날개 깃털이 여러 번 겹쳐지는 구조는 깃털의 분리를 어렵게 만들어 상승운동시 항력을 극복하는 능력을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이륙에 방해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오늘날 새들의 날개는 쉽게 분리되는 긴 깃털들이 단 한 층만 있고 긴 깃털들 사이에 짧은 깃털이 끼어있는 창문용 블라인드 같은 구조로 돼 있어 날개를 재빨리 올릴 수 있고 저속 비행중 날개를 퍼덕일 수 있다.
연구진은 시조새와 안키오르니스의 깃털 구조는 이런 동작을 할 수 없어 땅바닥으로부터의 이륙과 저속의 퍼덕임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포식동물들이 사방에 우글대는 상황에서는 나무들 사이를 이동하는 활공 능력만 갖고 있어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들은 곤충과 도마뱀, 작은 포유동물 등을 잡아 먹을 수 있는 나무 위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추측했다.
학자들은 오늘날 새들의 날개 구조가 2천만~3천만 년 사이에 진화해 이후 지난 1억3천만년 동안 대체로 변하지 않고 유지돼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들은 이미 1억3천만년 전에 효율적인 설계를 완성했으며 그보다 더 향상시키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6천500만년 전 육지 공룡들이 멸종했을 때도 새들은 이처럼 효율적인 신체 구조와 작은 몸집 덕분에 살아 남았다는 것이다.
새는 '활강 공룡'의 후손
날아 오르진 못했지만 높은 곳에서 활강하는 방식으로 이동했던 깃털 달린 공룡들이 오늘날 새의 조상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고 디스커버리 뉴스가 21일 최신 연구를 인용 보도했다.
미국 예일대 연구진은 약 1억5천500만년 전에 살았던 안키오르니스(Anchiornis huxley)와 1억6천800만~1억5천200만년 전에 살았던 에피덱시프테릭스(Epidexipteryx) 등 깃털 달린 활강 공룡들이 조류의 시조임을 입증하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지금까지 최고(最古)의 새로 알려진 `시조새'(Archaeopteryx)와 안키오르니스의 화석을 조사한 결과 둘의 날개 깃털이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지 않고 둘 사이의 차이는 날개의 진화 과정에서 초기의 실험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화의 본질상 어느 시점에서 공룡이 끝나고 새가 시작됐는지 분명한 구분은 없다. 깃털은 처음엔 보온용 솜털로 시작해 점차 날개로 발전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시조새는 여러 겹의 긴 비행용 깃털을 갖고 있었지만 안키오르니스는 펭귄의 깃털처럼 단순한 띠 모양의 깃털들이 풍성하게 겹쳐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연구진은 긴 날개 깃털이 여러 번 겹쳐지는 구조는 깃털의 분리를 어렵게 만들어 상승운동시 항력을 극복하는 능력을 크게 떨어뜨림으로써 이륙에 방해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오늘날 새들의 날개는 쉽게 분리되는 긴 깃털들이 단 한 층만 있고 긴 깃털들 사이에 짧은 깃털이 끼어있는 창문용 블라인드 같은 구조로 돼 있어 날개를 재빨리 올릴 수 있고 저속 비행중 날개를 퍼덕일 수 있다.
연구진은 시조새와 안키오르니스의 깃털 구조는 이런 동작을 할 수 없어 땅바닥으로부터의 이륙과 저속의 퍼덕임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포식동물들이 사방에 우글대는 상황에서는 나무들 사이를 이동하는 활공 능력만 갖고 있어도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을 것이며 이들은 곤충과 도마뱀, 작은 포유동물 등을 잡아 먹을 수 있는 나무 위에서 살았을 것이라고 연구진은 추측했다.
학자들은 오늘날 새들의 날개 구조가 2천만~3천만 년 사이에 진화해 이후 지난 1억3천만년 동안 대체로 변하지 않고 유지돼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들은 이미 1억3천만년 전에 효율적인 설계를 완성했으며 그보다 더 향상시키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6천500만년 전 육지 공룡들이 멸종했을 때도 새들은 이처럼 효율적인 신체 구조와 작은 몸집 덕분에 살아 남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