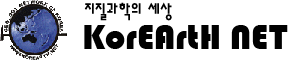새소식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과학흥미 더 떨어뜨리는 자연사박물관
쿠키뉴스
0
12,451
2007.12.03 00:15
[쿠키뉴스: 2007-12-02]
[쿠키 사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연사 박물관의 설명문이 지나치게 어렵고 딱딱해 일반 관람객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김찬종 교수(지구과학교육과) 연구팀은 2일 국내 대표적 자연사박물관인 국립중앙과학관(대전 구성동)에 전시된 지구과학 관련 전시물의 설명문 7개를 표본추출해 분석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김 교수 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설명문에 사용된 단어 중 45%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 과학용어들이었다. 일상용어는 3%에 불과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한반도 생성과정: 5억년 전은 지질시대 상으로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의 경계에 해당된다. 이 무렵 한반도의 북부를 덮고 있었던 소위 상원기 바다가 물러가고 조선기 바다가…(이하 생략). 이 설명문을 이해하려면 별도로 지질학 전공서적이나 백과사전을 뒤져야 할 판이다.
지진의 설명문도 마찬가지다. “지진: 지각의 일부에 변형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암석들이 쪼개질 때 이 지점에 국지적으로 모인 탄성·화학·중력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어 생긴 지진파가 지면에 도달하면…(이하 생략).” 문장이 길 뿐 아니라 복잡한 전문 용어가 남발하고 있다.
반면 미국 뉴욕의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지진과 관련한 설명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 ‘지진학자들은 지진의 상대적인 진도와 영향을 어떻게 비교할까요?’와 같은 의문문을 사용,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은 지진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서로 다른 구조와 재료로 만들어진 세 종류의 돼지집을 제시한뒤 관람객에게 ‘어떤 돼지 집이 지진을 잘 견딜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호주 자연사 박물관은 지진을 일으키는 ‘접속 변성작용’ 과 같은 전문용어 대신 요리와 빵 굽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현상과 용어로 설명해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과학용어 사용 비율을 35%로 낮추고, 일상용어를 13%나 쓴 점도 우리의 경우와 비교된다.
김 교수는 “국내 자연사 박물관 설명문은 방문객들에게 과학 문화를 오히려 낯설게 느끼도록 만들어 흥미를 떨어뜨린다”면서 “방문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전달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쿠키 사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연사 박물관의 설명문이 지나치게 어렵고 딱딱해 일반 관람객의 흥미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김찬종 교수(지구과학교육과) 연구팀은 2일 국내 대표적 자연사박물관인 국립중앙과학관(대전 구성동)에 전시된 지구과학 관련 전시물의 설명문 7개를 표본추출해 분석한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김 교수 팀의 연구에 따르면 이들 설명문에 사용된 단어 중 45%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전문 과학용어들이었다. 일상용어는 3%에 불과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한반도 생성과정: 5억년 전은 지질시대 상으로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의 경계에 해당된다. 이 무렵 한반도의 북부를 덮고 있었던 소위 상원기 바다가 물러가고 조선기 바다가…(이하 생략). 이 설명문을 이해하려면 별도로 지질학 전공서적이나 백과사전을 뒤져야 할 판이다.
지진의 설명문도 마찬가지다. “지진: 지각의 일부에 변형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암석들이 쪼개질 때 이 지점에 국지적으로 모인 탄성·화학·중력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어 생긴 지진파가 지면에 도달하면…(이하 생략).” 문장이 길 뿐 아니라 복잡한 전문 용어가 남발하고 있다.
반면 미국 뉴욕의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지진과 관련한 설명 방식이 우리와 다르다. ‘지진학자들은 지진의 상대적인 진도와 영향을 어떻게 비교할까요?’와 같은 의문문을 사용,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자연사박물관은 지진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서로 다른 구조와 재료로 만들어진 세 종류의 돼지집을 제시한뒤 관람객에게 ‘어떤 돼지 집이 지진을 잘 견딜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던진다.
호주 자연사 박물관은 지진을 일으키는 ‘접속 변성작용’ 과 같은 전문용어 대신 요리와 빵 굽기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현상과 용어로 설명해 관람객의 눈길을 끌고 있다. 과학용어 사용 비율을 35%로 낮추고, 일상용어를 13%나 쓴 점도 우리의 경우와 비교된다.
김 교수는 “국내 자연사 박물관 설명문은 방문객들에게 과학 문화를 오히려 낯설게 느끼도록 만들어 흥미를 떨어뜨린다”면서 “방문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정보전달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