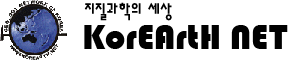새소식
朴정부, ‘자원외교’ 실종 4강 외교만 치중… 2번째 교역대상 ‘아세안’ 뒷전
푸른산
0
7,994
2013.05.25 10:02
[문화일보; 2013년 5월 25일]
박근혜정부에서 대(對)동남아·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외교가 ‘실종’됐다.
아세안이 한국의 2번째 교역대상이라는 경제적 중요성뿐 아니라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정치적·전략적 요충지인데도 박근혜정부가 북한과 4강 외교에만 치중하면서 뒷전에 밀쳐 두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동남아 외교전략 실종은 2월 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자원외교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과도 맞물리고 있다. 당장 박근혜정부에서 ‘에너지·자원 대사’ 자리가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구체성이 결여된 ‘창조경제외교’ ‘행복외교’가 그 자리를 꿰찼다.
박근혜정부의 이 같은 분위기는 20∼24일 열린 재외공관장회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에너지·자원외교에 대한 언급은 일절 사라진 반면, 보다 전통적 개념의 ‘경제외교’가 주요 화두였다.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경제부흥’에 걸맞은 ‘창조경제외교’에 초점을 맞춘 것.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의 ‘자원 없는 나라의 국가경영 창조경제’ 주제 강연과 파주 U-시티·3D 애니메이션 제작사 등 ‘창조경제’와 밀접한 산업현장 방문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외교부는 ‘창조경제’ 중점공관, 창조경제 담당관 제도 등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외교부가 발표한 ‘경제외교 강화 8대 과제’에서도 ‘창조경제외교’는 2번째로 꼽혔지만 에너지·자원외교는 7번째에 겨우 이름을 올렸다. 그나마도 안정적 에너지 수급, 원전수주 등과 같이 ‘방어적’ 냄새가 훨씬 짙어졌다. 외교부는 3월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원전수주·신재생에너지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 등 전통적 개념의 에너지·자원외교 정책만 원론적으로 밝혔다. 130대 국정과제에 셰일가스·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양·질적 측면 모두 빈약하다.
이러다 보니 동남아·아프리카·중남미 등 핵심 에너지·자원외교 대상국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낮아지면서 딱 떨어지는 외교전략 부재도 심각하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박근혜정부가 에너지·자원외교 명칭을 ‘에너지·안보외교’로 바꿔 ‘안보’ 개념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적극성이 크게 후퇴했고 선제적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다. 21세기 ‘복합외교’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의 자원외교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이명박정부보다 조용히 접근하기 때문이지 자원외교가 없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미·중 간 각축장이 된 대(對)아세안 외교는 방향성조차 보이지 않는다. 외교부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서남아는 우리 경제 지속성장의 핵심 동력원”이라고만 밝혔을 뿐 그 이후 특별한 외교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중국·일본의 아세안 공략은 치열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취임 뒤 처음으로 순방에 나선 곳이 동남아 3개국이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첫 방문지로 동남아를 택했다. 중국은 동남아 지역에 ‘무차별적’ 대규모 원조로 착실히 터전을 닦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1년 한·메콩강 장관급협의체, 한·아세안센터 등을 발족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역부족인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아직 동남아 외교 돛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정홍원 총리가 최근 ‘4대강 수출’을 위해 태국을 방문한 데 이어 박 대통령이 24일 인도네시아 국가경제위원장과 접견하는 등 뒤늦게 시동을 걸고 있지만, 체계적인 접근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
박근혜정부에서 대(對)동남아·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외교가 ‘실종’됐다.
아세안이 한국의 2번째 교역대상이라는 경제적 중요성뿐 아니라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정치적·전략적 요충지인데도 박근혜정부가 북한과 4강 외교에만 치중하면서 뒷전에 밀쳐 두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동남아 외교전략 실종은 2월 말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자원외교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과도 맞물리고 있다. 당장 박근혜정부에서 ‘에너지·자원 대사’ 자리가 소리소문도 없이 사라졌다. 대신 구체성이 결여된 ‘창조경제외교’ ‘행복외교’가 그 자리를 꿰찼다.
박근혜정부의 이 같은 분위기는 20∼24일 열린 재외공관장회의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에너지·자원외교에 대한 언급은 일절 사라진 반면, 보다 전통적 개념의 ‘경제외교’가 주요 화두였다.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경제부흥’에 걸맞은 ‘창조경제외교’에 초점을 맞춘 것.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의 ‘자원 없는 나라의 국가경영 창조경제’ 주제 강연과 파주 U-시티·3D 애니메이션 제작사 등 ‘창조경제’와 밀접한 산업현장 방문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외교부는 ‘창조경제’ 중점공관, 창조경제 담당관 제도 등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외교부가 발표한 ‘경제외교 강화 8대 과제’에서도 ‘창조경제외교’는 2번째로 꼽혔지만 에너지·자원외교는 7번째에 겨우 이름을 올렸다. 그나마도 안정적 에너지 수급, 원전수주 등과 같이 ‘방어적’ 냄새가 훨씬 짙어졌다. 외교부는 3월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원전수주·신재생에너지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 등 전통적 개념의 에너지·자원외교 정책만 원론적으로 밝혔다. 130대 국정과제에 셰일가스·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이 포함되기는 했지만 양·질적 측면 모두 빈약하다.
이러다 보니 동남아·아프리카·중남미 등 핵심 에너지·자원외교 대상국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낮아지면서 딱 떨어지는 외교전략 부재도 심각하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박근혜정부가 에너지·자원외교 명칭을 ‘에너지·안보외교’로 바꿔 ‘안보’ 개념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적극성이 크게 후퇴했고 선제적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다. 21세기 ‘복합외교’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박근혜정부의 자원외교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이명박정부보다 조용히 접근하기 때문이지 자원외교가 없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미·중 간 각축장이 된 대(對)아세안 외교는 방향성조차 보이지 않는다. 외교부도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서남아는 우리 경제 지속성장의 핵심 동력원”이라고만 밝혔을 뿐 그 이후 특별한 외교전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과 중국·일본의 아세안 공략은 치열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취임 뒤 처음으로 순방에 나선 곳이 동남아 3개국이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한 이후 첫 방문지로 동남아를 택했다. 중국은 동남아 지역에 ‘무차별적’ 대규모 원조로 착실히 터전을 닦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1년 한·메콩강 장관급협의체, 한·아세안센터 등을 발족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역부족인 상황에서 박근혜정부는 아직 동남아 외교 돛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정홍원 총리가 최근 ‘4대강 수출’을 위해 태국을 방문한 데 이어 박 대통령이 24일 인도네시아 국가경제위원장과 접견하는 등 뒤늦게 시동을 걸고 있지만, 체계적인 접근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신보영 기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