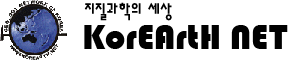새소식
비리·빈껍데기 논란 얼룩진 ‘MB 자원외교’
푸른산
0
8,129
2013.05.25 10:06
[문화일보; 2013년 5월 25일]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는 명암이 크게 엇갈린다. 정권 초기부터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빠른 행보를 보인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정권 실세들이 이를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 문제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측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주도한 자원외교 사례에서 이 같은 의혹이 많았다. 이 전 의원이 주도한 볼리비아 리튬광산 개발사업은 볼리비아가 Li 채굴권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난관에 봉착했고, 나미비아 우라늄 개발사업은 사업이 종료됐다. 박 전 차관이 주도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은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미얀마 석유광구도 ‘빈 광구’로 드러나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국영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2008~2011년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 등 관련 공기업에 투입된 예산은 무려 5조 원이 넘는다. 사업성 검토는 뒷전이고 정권의 ‘치적 쌓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은 많지 않았다는 비판도 따른다. 자원개발의 경제성을 확인하려면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성공률도 낮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너무 과잉 홍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자원외교의 성과와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조 원짜리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을 따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후 탐사과정에 4400억 원이나 투입했음에도 원유나 가스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석유공사는 5개 광구 가운데 2곳의 지분을 반납해야 했다. 최근 나머지 광구 중 1곳에서 원유가 발견돼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전체 매장량이 파악되지 않은 데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됐다. 2009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정부는 리아우 화력발전소 및 유연탄 개발사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수개월 전 이미 한국중부발전이 사업성 검토 후 접은 것이었다. 이름만 바꿔 MOU를 급조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체결된 총 71건의 자원개발 MOU 가운데 본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는 명암이 크게 엇갈린다. 정권 초기부터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발빠른 행보를 보인 것까지는 괜찮았지만, 정권 실세들이 이를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 문제로 얼룩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측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이 주도한 자원외교 사례에서 이 같은 의혹이 많았다. 이 전 의원이 주도한 볼리비아 리튬광산 개발사업은 볼리비아가 Li 채굴권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난관에 봉착했고, 나미비아 우라늄 개발사업은 사업이 종료됐다. 박 전 차관이 주도한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사업은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고, 미얀마 석유광구도 ‘빈 광구’로 드러나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국영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2008~2011년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 등 관련 공기업에 투입된 예산은 무려 5조 원이 넘는다. 사업성 검토는 뒷전이고 정권의 ‘치적 쌓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은 많지 않았다는 비판도 따른다. 자원개발의 경제성을 확인하려면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성공률도 낮은 상황에서 정치인들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너무 과잉 홍보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정부는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자원외교의 성과와 홍보에 열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조 원짜리 이라크 쿠르드 유전개발사업을 따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후 탐사과정에 4400억 원이나 투입했음에도 원유나 가스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석유공사는 5개 광구 가운데 2곳의 지분을 반납해야 했다. 최근 나머지 광구 중 1곳에서 원유가 발견돼 한숨을 돌렸지만, 여전히 전체 매장량이 파악되지 않은 데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됐다. 2009년 3월 이 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정부는 리아우 화력발전소 및 유연탄 개발사업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수개월 전 이미 한국중부발전이 사업성 검토 후 접은 것이었다. 이름만 바꿔 MOU를 급조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체결된 총 71건의 자원개발 MOU 가운데 본계약으로 이어진 경우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