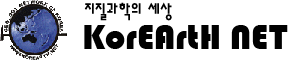새소식
'CO₂시장'은 더티 게임을 한다
쏘니
0
7,301
2009.07.31 11:58
2009.07.30 <조선닷컴>
온실가스인 CO₂의 배출권을 거래해 온난화를 막자는 것이 세계 대세다. 우리도 온실가스 거래제 도입을 명시한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배출권 거래를 '캡 앤 트레이드(cap & trade)'라고 한다. '캡'은 배출 총량에 모자를 씌워 제한하는 걸 말한다. A국가는 연간 1억t, B국가는 2억t 하는 식이다. 각국 정부는 자국 할당량을 1만t, 2만t씩 기업들에 쪼개주며 모자를 씌운다. '트레이드'는 할당량이 남게 된 기업이 할당량이 모자라는 기업에 여분의 배출권을 파는 걸 의미한다.
배출권 거래는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제도다. 기업 a는 10만t을 줄이는 데 10억원이 들고, 기업 b는 5억원이면 된다고 치자. a는 10억원을 들여 10만t을 줄이는 대신 b에게서 10만t의 배출감축 실적을 7억5000만원에 사들인다. 그러면 a도 2억5000만원, b도 2억5000만원 이득을 본다.
전에 없던 게임의 규칙이 도입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생기고 손해 보는 사람도 생긴다. 생산 특성상 CO₂를 쉽게 줄일 수 있는 전력회사 같은 기업은 배출량을 많이 줄인 후 그 실적을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다. 황당하게 돈을 버는 기업도 생긴다. 우리는 아직 CO₂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기업이 기존 공정을 뜯어고쳐 온실가스를 줄인 후 그 실적만큼의 배출권을 선진국 기업에 팔 수는 있다. 울산 어느 냉매(冷媒) 업체의 제조공정에선 HFC23 가스가 나온다. HFC23은 단위당 온난화 능력이 이산화탄소의 1만1700배나 되는 강력 온실가스다. 냉매 업체는 배출되는 HFC23을 모아 소각처리하는 설비를 장착했다. 60억원 정도 들었다고 한다. 그런 후 2005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연간 CO₂ 140만t씩의 배출권을 챙겼다. 지금 유럽 CO₂시장의 시세(t당 14유로, 약 2만4500원)로 따져 연 343억원어치다. 그 업체를 본떠 유사한 배출권 프로젝트가 중국 등에서 꽤 생겨났다. 엄밀히 따져 이들 기업은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를 오염시켜온 곳들이다. 그런데도 온난화 관련 규제가 시작되자 노다지를 캐고 있다. 이른바 '횡재 이윤'(windfall profit)이다.
국가나 기업에 배출권을 나눠줄 때는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기득권을 인정하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이라는 관행이다. 이 관행이 그대로 적용되면 어떤 선진국은 1인당 연간 20t의 CO₂배출권을 인정받고 어떤 개도국은 2t밖에 배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 개도국은 그러지 않아도 못살아 서러운데 앞으로도 마음껏 경제성장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된다. 화석연료를 많이 태워 지구를 오염시켜온 나라는 과거 오염실적이 많다고 해서 많은 배출권을 배정받고, 때에 따라선 그 배출권을 팔아 돈을 벌 수가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더러운(dirty)' 공정을 일부러 폐기하지 않은 기업이 더 많은 배출권을 확보해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오염자부담 원칙과는 완전 거꾸로다.
러시아 등 동구권 국가들은 1990년대 들어 경제가 곤두박질쳤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 CO₂ 배출량도 크게 줄었다. 원칙대로라면 배출량이 줄어든 만큼 남아도는 배출권을 팔 수가 있다. 서구 기업이 그 배출권을 사들여 추가로 CO₂를 배출시켰다고 치자. 배출권 거래제만 아니라면 없었을 추가적인 CO₂ 배출이 생겨난 것이다. 온난화를 더 가속시킨다는 뜻에서 이걸 '핫 에어(hot air)'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에너지 소비량이 많게는 한 해 10%씩 늘어났다. 우리도 2012년 이후로는 배출규제를 받게 될 공산이 크다. 그동안 CO₂ 배출량을 한껏 늘려왔기 때문에 그랜드파더링 원칙에 따라 더 많은 할당량을 배정받아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온난화라는 지구적 과제를 놓고 개별 국가가 자기 이익만 챙기려 든다면 떳떳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굴러왔다. 올 12월 코펜하겐 기후협약 총회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국익을 크게 좌우할 수가 있다.
온실가스인 CO₂의 배출권을 거래해 온난화를 막자는 것이 세계 대세다. 우리도 온실가스 거래제 도입을 명시한 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배출권 거래를 '캡 앤 트레이드(cap & trade)'라고 한다. '캡'은 배출 총량에 모자를 씌워 제한하는 걸 말한다. A국가는 연간 1억t, B국가는 2억t 하는 식이다. 각국 정부는 자국 할당량을 1만t, 2만t씩 기업들에 쪼개주며 모자를 씌운다. '트레이드'는 할당량이 남게 된 기업이 할당량이 모자라는 기업에 여분의 배출권을 파는 걸 의미한다.
배출권 거래는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제도다. 기업 a는 10만t을 줄이는 데 10억원이 들고, 기업 b는 5억원이면 된다고 치자. a는 10억원을 들여 10만t을 줄이는 대신 b에게서 10만t의 배출감축 실적을 7억5000만원에 사들인다. 그러면 a도 2억5000만원, b도 2억5000만원 이득을 본다.
전에 없던 게임의 규칙이 도입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도 생기고 손해 보는 사람도 생긴다. 생산 특성상 CO₂를 쉽게 줄일 수 있는 전력회사 같은 기업은 배출량을 많이 줄인 후 그 실적을 시장에 내다 팔 수가 있다. 황당하게 돈을 버는 기업도 생긴다. 우리는 아직 CO₂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기업이 기존 공정을 뜯어고쳐 온실가스를 줄인 후 그 실적만큼의 배출권을 선진국 기업에 팔 수는 있다. 울산 어느 냉매(冷媒) 업체의 제조공정에선 HFC23 가스가 나온다. HFC23은 단위당 온난화 능력이 이산화탄소의 1만1700배나 되는 강력 온실가스다. 냉매 업체는 배출되는 HFC23을 모아 소각처리하는 설비를 장착했다. 60억원 정도 들었다고 한다. 그런 후 2005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연간 CO₂ 140만t씩의 배출권을 챙겼다. 지금 유럽 CO₂시장의 시세(t당 14유로, 약 2만4500원)로 따져 연 343억원어치다. 그 업체를 본떠 유사한 배출권 프로젝트가 중국 등에서 꽤 생겨났다. 엄밀히 따져 이들 기업은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를 오염시켜온 곳들이다. 그런데도 온난화 관련 규제가 시작되자 노다지를 캐고 있다. 이른바 '횡재 이윤'(windfall profit)이다.
국가나 기업에 배출권을 나눠줄 때는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삼게 된다. 기득권을 인정하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이라는 관행이다. 이 관행이 그대로 적용되면 어떤 선진국은 1인당 연간 20t의 CO₂배출권을 인정받고 어떤 개도국은 2t밖에 배정받지 못할 수가 있다. 개도국은 그러지 않아도 못살아 서러운데 앞으로도 마음껏 경제성장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된다. 화석연료를 많이 태워 지구를 오염시켜온 나라는 과거 오염실적이 많다고 해서 많은 배출권을 배정받고, 때에 따라선 그 배출권을 팔아 돈을 벌 수가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기존의 '더러운(dirty)' 공정을 일부러 폐기하지 않은 기업이 더 많은 배출권을 확보해 수익을 올릴 수가 있다. 오염자부담 원칙과는 완전 거꾸로다.
러시아 등 동구권 국가들은 1990년대 들어 경제가 곤두박질쳤다. 공장이 돌아가지 않아 CO₂ 배출량도 크게 줄었다. 원칙대로라면 배출량이 줄어든 만큼 남아도는 배출권을 팔 수가 있다. 서구 기업이 그 배출권을 사들여 추가로 CO₂를 배출시켰다고 치자. 배출권 거래제만 아니라면 없었을 추가적인 CO₂ 배출이 생겨난 것이다. 온난화를 더 가속시킨다는 뜻에서 이걸 '핫 에어(hot air)'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에너지 소비량이 많게는 한 해 10%씩 늘어났다. 우리도 2012년 이후로는 배출규제를 받게 될 공산이 크다. 그동안 CO₂ 배출량을 한껏 늘려왔기 때문에 그랜드파더링 원칙에 따라 더 많은 할당량을 배정받아 이득을 볼 수도 있다. 온난화라는 지구적 과제를 놓고 개별 국가가 자기 이익만 챙기려 든다면 떳떳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굴러왔다. 올 12월 코펜하겐 기후협약 총회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국익을 크게 좌우할 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