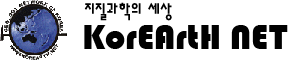묻고 답하기
61번 글에 대한 논의
류충렬
일반
0
13,342
2001.03.15 21:08
크게보면 절리도 틈이고 구조선도 틈입니다. 지구의 지각과 그 주변에 생기는. 그러면 틈
은 왜 생기는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틈은 한마디로 힘의 불균
형에 의해 생기기 쉽습니다. 당신의 손에 풍선을 들고 원하는 방향으로 눌러본다면 손으
로 작용하는 곳보다 힘이 약한 부분으로 풍선은 삐져나갈 것입니다. 어떠하건간에 지구의
지각과 그 주변도 딱딱하긴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읍니다. 힘의 균형이 약해진 방향으
로 삐져나가려 하는 성질을 가지지요. 상부가 삭박되어 제거된다면 그 힘의 공백을 암석
도 찾아가지요. 그런데 그냥갈 수 없어서 한 방편으로 틈을 만들면서 삐져나간답니다. 그
런데 질문의 중요한 부분은 구조선과의 관계입니다. 지구상의 큰 구조선이 지판의 이동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지각과 그 주변의 공백도 지판의 수평이동에 관련된
횡압력(옆구리를 찌르듯이 지판의 면에 평행하게 옆에서 밀어서 생기는 압력?)에 의해 생
긴다고 하기 쉽지요. 지판의 이동과 관련된 구조선은 크게 세종류입니다. 판이 멀어지면서
벌어지는 곳에서 생기는 구조선, 판이 가까워지면서 서로 밀리거나 비껴나면서 생기는 구
조선입니다. 어떤 경우이건간에 구조선에 평행한 절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판이 멀어지는
곳에서는 힘이 가해져 당기는 방향이 곧 전체적으로 볼 때 힘의 공백(상대적으로 힘이 약
한)방향입니다. 그 방향으로 삐져나가야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방향에 수직하게 제몸을
자르면서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뜨끈뜨끈한 떡이었다면 그냥 늘어나면 그만이겠지
만. 절리가 생기는 암석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니. 판이 멀어지는 경우도 그리 단순하지 않
읍니다만, 판이 가까워지는 곳은 더 문제 입니다. 양쪽에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밀어대니 삐져나갈 곳은 두 방향입니다. 위로 아니면 옆으로. 밀어붙이는 힘에 대해 삐져
나가도록하는 주된 역할담당자가 구조선입니다. 이 주된 구조선이 생기기 전이나 생겨서
도 계속되는 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절리들이 생겨납니다. 절리와 구조선은 닭과 달걀
의 관계입니다. 절리들이 연결되어 크게된 놈이 구조선이기도 하니까요. 여기서 이 문제
를 짚어 볼 수 있읍니다. 절리와 구조선이 평행하게 생긴다. 이건 정답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절리가 크게된 것이 구조선이니까요. 그러면 방향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하는 문
제가 생기게 되죠. 뒤집어 보면 구조선이 되지못한 것이 절리라는 것입니다. 암석에 힘을
주어 어디로 어떻게 삐져나가는가(파쇄하는가)?하는 실험을 한다면 크게 보아 세방향의 틈
이 주로 생깁니다. 삐져나갈 방향에 평행하게 틈을 만드는 것이 그 첫번째입니다. 그야말
로 벌어지는 틈입니다. 삐져나갈 방향에 각도를 가지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이건 그냥 벌
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끌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두 방향이 호형호재하면서 짝을
이루게 되죠. 공액상이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냥 벌어지는 것 보다 미끌어지는 것이
대체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틈입니다. 실험에서는 첫벗째의 벌어지는 틈은 미세하여 보
통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할 순간이 옵니다. 실험이 아니라 한반도
나 만주 그리고 아슈로프리카(아시아+유럽+아프리카)의 땅덩이 규모로 실험의 장을 확대한
다면 그 작았던 틈도 만만치 않읍니다. 스스로 구조선이라 하기도할 법하죠. 하여간 이
세 방향이 한꺼번에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절리와 이를 넘어 구조선으로 진화하기 위한
그 다음의 문제를 짚어보면, 절리와 구조선의 관계 문제가 한 부분 해결이 됩니다. 이렇
게 생겨난 세 방향의 틈들 가운데 계속되는 힘에 대해 선별적으로 어떤 것들이 발전, 진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별되어 진화하게된 것이 구조선이고 허다하고 허다한 것이 절리라
고 보면 어떻겠읍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읍니다. 그러고나서도 구조선과 절리의 관계는 계
속됩니다. 절리가 선별되어 구조선이 되는 것은 이제 그만하죠. 그런데 구조선이 절리가
생겨나는데 올챙이 시절은 생각지도 않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재미난 사실입니다. 두가지
가 있읍니다. 하나는 큰 구조선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해 그 형태를 쉽게 무너뜨리
지 않읍니다. 제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까지 가지게 된 거죠. 힘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
죠. 그래서 힘의 방향을 어느 정도 바꾸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규모가 커졌으니 힘에 대
해 스스로 움직이면서도 구조선에 맥을 같이하는 절리를 만들고 이들을 규합하고, 새로운
구조선과 만나 또 더 큰 구조선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의 장에 있는 절리들은 절대
적으로 연결되려는 두 두조선의 영향을 받읍니다. 절리 자체가 틈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는 쉽습니다. 그러나 절리가 구조선과 어떤 방향성과 관계를 가지는가는 이렇게해서 간단
하지 않읍니다. 구조선이 힘을 바꾸기 때문이죠. 구조선과 한방에서 생겨난 절리(한방절
리?)들과 구조선에 영향을 받아 생겨난 절리(영향만 받은 영향절리?와 구조선 연결시의 합
방절리?랄까요)는 다르게 존재하죠. 그러나 어쩌겠읍니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리
와 구조선의 관계를 아는 것이 기초이며, 중요한 한 부분인데 말이죠. 넘어서 좀 더 생각
한다면, 구조선을 보고 절리를 이해하거나, 절리를 보고 쉽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구조
선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읍니까? 지질학을 위해서도 중요하죠. 왜냐구
요? 틈을 따라 광산이 되기위한 광화대가 형성되고, 온천이 생겨나고, 지하수가 유동하
고, 오염원이 전파되고, 지형이 형성되고, 산사태와 사면안정, 지반안정, 터널과 교랑,
댐 등 건설, 지하공간 개발에, 각종 지질자원이 부존하고, 마그마가 상승하고, 심성암이
자리하고, 화산의 터가 되고, 어쩌면 지진도 무관하지 않을수 도 있으니까요. 묘자리와 집
터에 대한 고전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 기회에 깊이를 더하십시오. 절리의 깊이 또는
구조선의 깊이까지 더해서. 만만찮은 절리와 구조선이 만만찮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접
근과 연구 그리고 깊은 인연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주변에 무수히 존재하고 있읍니
다. 인간의 삶처럼 그 족적의 끝과 깊이 그리고 파급효과를 가지면서 말입니다.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지질연구부 류충렬
은 왜 생기는 것인가? 라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틈은 한마디로 힘의 불균
형에 의해 생기기 쉽습니다. 당신의 손에 풍선을 들고 원하는 방향으로 눌러본다면 손으
로 작용하는 곳보다 힘이 약한 부분으로 풍선은 삐져나갈 것입니다. 어떠하건간에 지구의
지각과 그 주변도 딱딱하긴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있읍니다. 힘의 균형이 약해진 방향으
로 삐져나가려 하는 성질을 가지지요. 상부가 삭박되어 제거된다면 그 힘의 공백을 암석
도 찾아가지요. 그런데 그냥갈 수 없어서 한 방편으로 틈을 만들면서 삐져나간답니다. 그
런데 질문의 중요한 부분은 구조선과의 관계입니다. 지구상의 큰 구조선이 지판의 이동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지각과 그 주변의 공백도 지판의 수평이동에 관련된
횡압력(옆구리를 찌르듯이 지판의 면에 평행하게 옆에서 밀어서 생기는 압력?)에 의해 생
긴다고 하기 쉽지요. 지판의 이동과 관련된 구조선은 크게 세종류입니다. 판이 멀어지면서
벌어지는 곳에서 생기는 구조선, 판이 가까워지면서 서로 밀리거나 비껴나면서 생기는 구
조선입니다. 어떤 경우이건간에 구조선에 평행한 절리가 생기기 쉽습니다. 판이 멀어지는
곳에서는 힘이 가해져 당기는 방향이 곧 전체적으로 볼 때 힘의 공백(상대적으로 힘이 약
한)방향입니다. 그 방향으로 삐져나가야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방향에 수직하게 제몸을
자르면서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뜨끈뜨끈한 떡이었다면 그냥 늘어나면 그만이겠지
만. 절리가 생기는 암석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니. 판이 멀어지는 경우도 그리 단순하지 않
읍니다만, 판이 가까워지는 곳은 더 문제 입니다. 양쪽에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밀어대니 삐져나갈 곳은 두 방향입니다. 위로 아니면 옆으로. 밀어붙이는 힘에 대해 삐져
나가도록하는 주된 역할담당자가 구조선입니다. 이 주된 구조선이 생기기 전이나 생겨서
도 계속되는 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절리들이 생겨납니다. 절리와 구조선은 닭과 달걀
의 관계입니다. 절리들이 연결되어 크게된 놈이 구조선이기도 하니까요. 여기서 이 문제
를 짚어 볼 수 있읍니다. 절리와 구조선이 평행하게 생긴다. 이건 정답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절리가 크게된 것이 구조선이니까요. 그러면 방향이 다른 것은 무엇인가?하는 문
제가 생기게 되죠. 뒤집어 보면 구조선이 되지못한 것이 절리라는 것입니다. 암석에 힘을
주어 어디로 어떻게 삐져나가는가(파쇄하는가)?하는 실험을 한다면 크게 보아 세방향의 틈
이 주로 생깁니다. 삐져나갈 방향에 평행하게 틈을 만드는 것이 그 첫번째입니다. 그야말
로 벌어지는 틈입니다. 삐져나갈 방향에 각도를 가지는 것이 두번째입니다. 이건 그냥 벌
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끌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두 방향이 호형호재하면서 짝을
이루게 되죠. 공액상이라는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냥 벌어지는 것 보다 미끌어지는 것이
대체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틈입니다. 실험에서는 첫벗째의 벌어지는 틈은 미세하여 보
통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할 순간이 옵니다. 실험이 아니라 한반도
나 만주 그리고 아슈로프리카(아시아+유럽+아프리카)의 땅덩이 규모로 실험의 장을 확대한
다면 그 작았던 틈도 만만치 않읍니다. 스스로 구조선이라 하기도할 법하죠. 하여간 이
세 방향이 한꺼번에 생기기 쉽다는 겁니다. 절리와 이를 넘어 구조선으로 진화하기 위한
그 다음의 문제를 짚어보면, 절리와 구조선의 관계 문제가 한 부분 해결이 됩니다. 이렇
게 생겨난 세 방향의 틈들 가운데 계속되는 힘에 대해 선별적으로 어떤 것들이 발전, 진화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선별되어 진화하게된 것이 구조선이고 허다하고 허다한 것이 절리라
고 보면 어떻겠읍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읍니다. 그러고나서도 구조선과 절리의 관계는 계
속됩니다. 절리가 선별되어 구조선이 되는 것은 이제 그만하죠. 그런데 구조선이 절리가
생겨나는데 올챙이 시절은 생각지도 않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재미난 사실입니다. 두가지
가 있읍니다. 하나는 큰 구조선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해 그 형태를 쉽게 무너뜨리
지 않읍니다. 제 형태를 유지하려는 성질까지 가지게 된 거죠. 힘에 대한 일종의 저항이
죠. 그래서 힘의 방향을 어느 정도 바꾸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규모가 커졌으니 힘에 대
해 스스로 움직이면서도 구조선에 맥을 같이하는 절리를 만들고 이들을 규합하고, 새로운
구조선과 만나 또 더 큰 구조선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의 장에 있는 절리들은 절대
적으로 연결되려는 두 두조선의 영향을 받읍니다. 절리 자체가 틈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는 쉽습니다. 그러나 절리가 구조선과 어떤 방향성과 관계를 가지는가는 이렇게해서 간단
하지 않읍니다. 구조선이 힘을 바꾸기 때문이죠. 구조선과 한방에서 생겨난 절리(한방절
리?)들과 구조선에 영향을 받아 생겨난 절리(영향만 받은 영향절리?와 구조선 연결시의 합
방절리?랄까요)는 다르게 존재하죠. 그러나 어쩌겠읍니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절리
와 구조선의 관계를 아는 것이 기초이며, 중요한 한 부분인데 말이죠. 넘어서 좀 더 생각
한다면, 구조선을 보고 절리를 이해하거나, 절리를 보고 쉽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구조
선을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읍니까? 지질학을 위해서도 중요하죠. 왜냐구
요? 틈을 따라 광산이 되기위한 광화대가 형성되고, 온천이 생겨나고, 지하수가 유동하
고, 오염원이 전파되고, 지형이 형성되고, 산사태와 사면안정, 지반안정, 터널과 교랑,
댐 등 건설, 지하공간 개발에, 각종 지질자원이 부존하고, 마그마가 상승하고, 심성암이
자리하고, 화산의 터가 되고, 어쩌면 지진도 무관하지 않을수 도 있으니까요. 묘자리와 집
터에 대한 고전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이 기회에 깊이를 더하십시오. 절리의 깊이 또는
구조선의 깊이까지 더해서. 만만찮은 절리와 구조선이 만만찮은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접
근과 연구 그리고 깊은 인연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주변에 무수히 존재하고 있읍니
다. 인간의 삶처럼 그 족적의 끝과 깊이 그리고 파급효과를 가지면서 말입니다.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지질연구부 류충렬